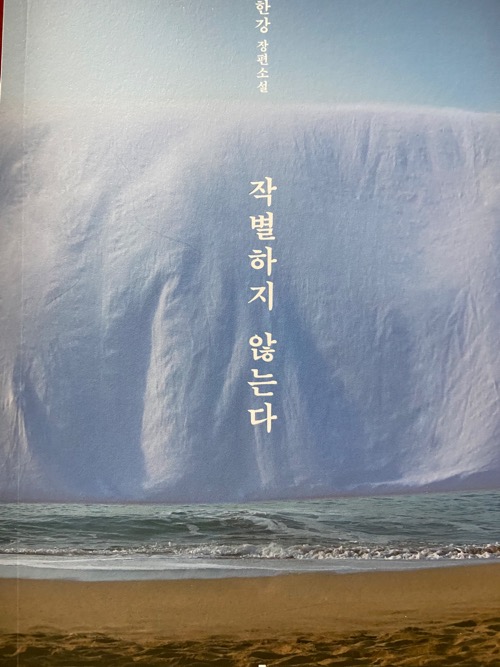내가 읽었던 한강의 소설들은 나를 힘들게 한다.
글로 씌어진 그녀의 문장은 끝이 뾰족하다가도 뭉뚱그려져 있어 나를 찌르다가 누르기도 한다. 종종 얇은 채찍처럼 휘감아 치기도 했다.
어둡고 습한 표현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현실들을 그녀는 담담하게 써내려 간다. 그녀는 죽음을 써내려가며 살아감에 대해 말한다. 그래서 힘들다. 읽고나면 아리다.
그러나 우리는 마주해야한다. 그렇게 직시하고 떠올리고 힘들어하며 느끼고 생각해야만 한다.
그것이 문학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 믿기 때문이다. 시대의 아픔은 누군가의 개인의 아픔이다. 누군가의 슬픔은 때로 시대의 슬픔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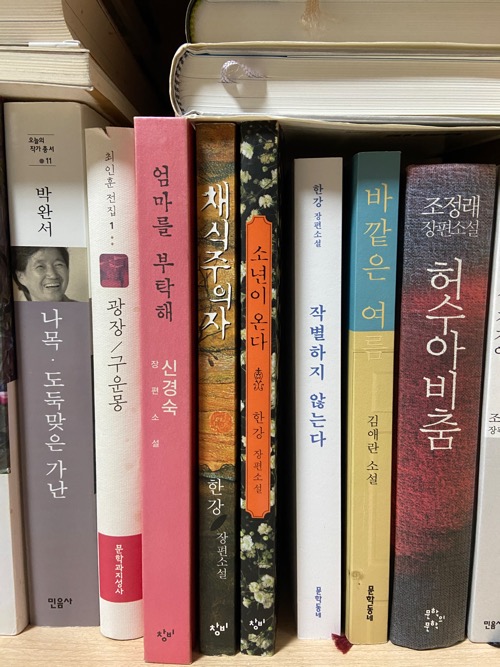
우리는 그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알아야 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또 되풀이 하면 안 될 책임이 있다.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도 또 내 주변의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기쁘고 밝은 면만 보고 누리기를 바란다.
그러나 인생은 이 세상은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어둡고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한 사건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어있다. 그때 주위에 책임을 가지고 함께 할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세상은 어떻게 기억될까? 그래서 그 누군가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슬픔과 아픔 가운데 찢겨나가는 고통속에도 그에게 내일을 갖게 해주는 견뎌내는 것이 아닌 살아가가게 해줄 것이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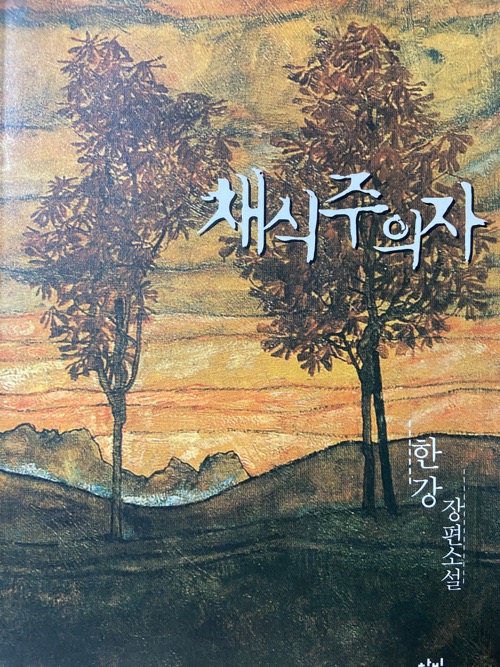
한강의 소설은 바로 그 누군가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다.
나는 입안이 자주 헌다. 유전적 요인이어서 어렸을적부터 함께 해온 입안의 고통은 익숙했다. 그 중 혀가 헐 때 가장 아팠다. 음식의 어떤 맛도 느끼지 못할 뿐더러 입안에 들어가는 어떤 것도 혀를 피할 수 없기에 고통이 자주 잘 느껴지는 부위다.
어느 날 처음으로 입 천장이 헐었다. 이제껏 느꼈던 어떤 고통보다 힘들고 아팠다. 왜지? 갑자기? 말할 때도 날카로운 아픔이 쑤셔대니 식욕 자체가 사라졌다. 치아까지 아파오는 고통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그러다 문득 이 고통이 시작된 이유가 이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읽는 중이었다. 그 책을 손에 들고 읽기 시작한즈음에 통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써내려간 글을 읽으며 저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과 미어지는 아픔이 늘 나를 감쌌는데 정말 그 때문일까? 내가 받은 아픔과 충격 그로인한 스트레스에 내 몸이 반응 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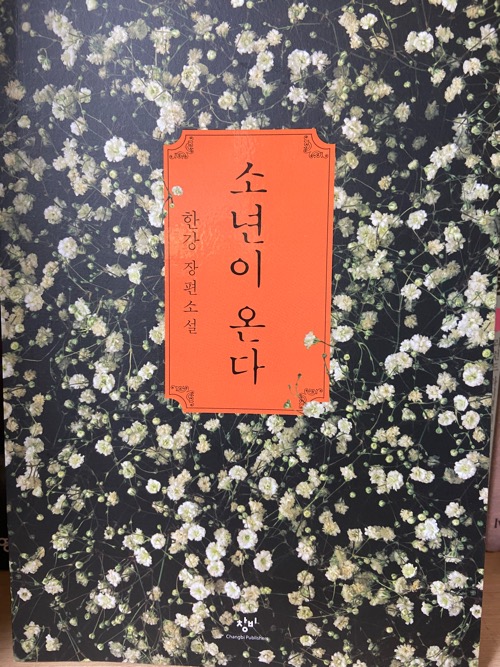
부모님 모두 전라도 분이시고 사촌들과 지인 중 5.18당시 광주에 있었던 이들이 있었기에 오래 전 들었고 알고 있던 부분도 있었지만 어느덧 세월이 꽤 흐르고 예전보다 철이 든 지금 읽고 접한 그 날의 일은 맑은 하늘의 가을과는 달리 여름날의 장마와 한 겨울의 차가운 고독함 뿐이었다. 그곳에서 그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데 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작별은 하지 않는다’를 구입하고도 책장에 꽂아둔 채 읽지 않았다. 또 아플까봐 그렇게 힘들까봐서….
다시 고통과 아픔을 몸으로 겪더라도 이겨낼 몸과 정신을 갖췄을 때 꺼내 보려했다. 곧 그럴 것 같다. 그녀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왔고 난 괜시리 뿌듯했으니까. 그리고 작은 기대를 갖게되었으니까. 누군가의 뼈저린 아픔이 많은 이들에게 나뉘어져 이제는 조금은 이제는 조금이라도 그들이 ……